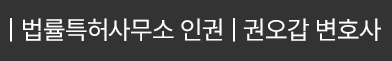저작권침해소송 대응 필요해
문화는 날이 갈수록 발달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문화산업에서 저작권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저작권법 중 저작인접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지적 재산권을 뜻합니다.
문화산업이 발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도 함께 발전해 실연자들이 설 무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디오 기기나 인터넷의 발달로 공연장에 가서 듣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들어도 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여파로 실연자의 공연을 찾는 대중은 줄어들었고 이에 사회적 인식도도 낮아져 기계로 인한 실업이 대량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접권으로 실연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연자는 성명 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실연 방송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보상 청구권, 전송권, 음반의 대여권, 디지털 음성 송신 보상 청구권 등의 권리를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작물침해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보며 저작인접권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음반 저작권에 대해 가수와 제작자 사이에 소송이 일어난 사례입니다.
 |
 |
ㄱ 씨는 음반의 작사, 작곡, 연주, 노래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음반 제작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작인접권 동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 예법에서는 악곡, 악보, 가창을 제외하고 음반을 저작물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제작자는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는 발행권으로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따로 규정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정이 되었고 이후 시행된 법에서는 음반제작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음반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담아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 때문에 ㄱ 씨는 법 개정 전에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20년간 작사, 작곡, 연주로 참여했던 음반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주장하며 저작권침해소송을 걸게 됐습니다.
1심에서는 ㄱ씨가 음반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책임과 기획자였기 때문에 음반제작자가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저작권법이 법이 개정된 후로 음반에 대해 새로운 저작권이 생긴다고 밝히며 ㄱ씨가 아닌 녹음 총괄자가 저작권자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넘어간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옛 저작권법에서는 녹음 자체를 창작 행위로 간주했으며 제작사가 ㄱ 씨의 음반을 녹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전부 부담했으므로 음반 저작권 또한 제작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 씨가 음반을 만드는데 참여해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바지한 것은 맞지만 저작인접권의 법률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음반 저작권의 존속 기간도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까지 존속하므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실연자가 죽고 난 후의 저작인접권을 다룬 사례입니다. a씨는 가수로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들을 많이 남긴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음반제작사는 a씨가 죽기 전 다시 부르기라는 음반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3년 뒤에 a씨는 세상을 떠났고 이에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가족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a씨가 죽은 후 체결한 가족 간의 합의서에서 발행되게 됩니다.
a씨의 부인과 부친이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계약상에서는 a씨가 죽기 전 음반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해서는 a씨의 부친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부친이 사망할 때는 a씨의 딸에게 귀속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a씨가 죽고 난 후 부인은 상속인의 권리가 생기게 되었고 그걸 본 a씨의 아내와 자식은 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저작권침해소송을 걸게 됩니다. 1심에서는 부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게 되었고, 2심 재판부는 기존의 저작권은 딸에게 있으며 새로운 음반을 만들 경우 그때부터 공동귀속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까지 넘어간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죽기 전 체결했던 4개 음반의 판권에 대해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새 음반을 제작하게 될 경우에 a씨의 부친과 부인에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저작권의 권리에 대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기도 하고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침해소송을 겪게 된다면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