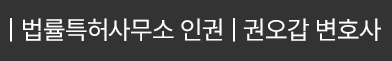직무발명보상제도 적용대상
회사에서는 자사의 상품 개발을 위해 연구원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연구를 지원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해 연구자가 직무상 이뤄낸 발명에 대해서 회사에서 특허권을 가지더라도 연구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주곤 하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적용대상을 두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라도 직무발명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사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A사에 근무중이던 B씨는 A사를 퇴사하면서 A사의 영업비밀인 기계 설계도면을 반출하였고 그 후 경쟁사인 B사에 입사하여 설계도면을 업무에 활용하였습니다.
이 같은 B씨의 행동은 덜미를 잡혔고 결국 B씨는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B씨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A사의 대표 이름으로 등록된 기계 설계에 관한 특허가 B씨의 직무발명이며 A사는 B씨와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 승계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B씨가 퇴사한 후 B씨가 모르게 특허를 신청하였다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주장하였는데요.
이번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B씨가 A사에 근무하며 설계팀장 직책으로 관련된 기계 개발 업무를 담당한 점과 기술 회의 등에 참여한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무적인 작업을 B씨가 담당한 사실 등을 인정해 B씨가 설계도면을 유출한 기계에 공동발명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에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이 내려졌다 해도 영업비밀과 특허 내용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공동발명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의 무단사용과 공개로 인해 침해가 가능하므로 B씨의 공동발명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사가 B씨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A사는 B씨에게 4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영업비밀 침해로 인하여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